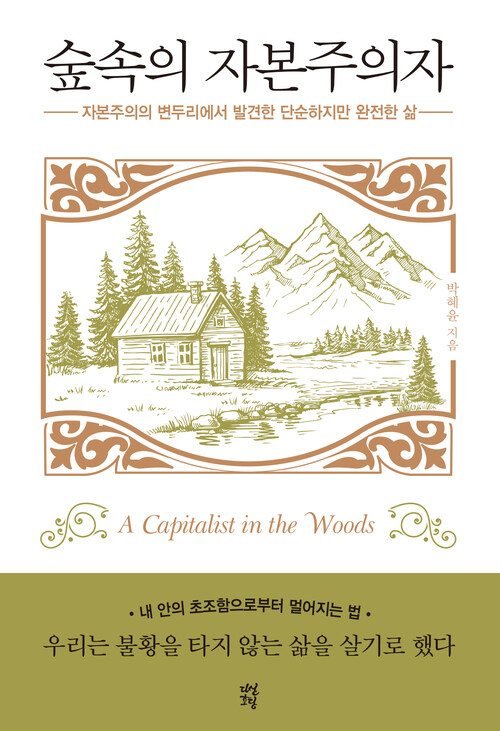불안한 시대를 건너는
생각의 힘
다산북스 인문/사회 추천 도서 할인전 & 추가 쿠폰
타인이라는 세계
서울대 의대생들을 열광시킨 홍순범 교수의 ‘마음이론’ 강의. 타인과 갈등이 생기면 타인을 성격이나 도덕성으로 판단하는 우리의 습관이 뇌의 구조적 한계와 편향에서 비롯된 것임을 뇌과학, 심리학, 정신의학 연구로 설명한다. 언어의 미묘한 차이, 기억과 인지의 오류, 정보의 부족이 어떻게 오해와 갈등을 낳는지를 다양한 사고실험과 사례로 보여준다. 마음이론을 제한된 정보 위에서 ‘자기만의 설명’을 만들어내는 능력으로 말하며, 우리가 왜 서로를 오해할 수밖에 없는지 짚는다. 나아가 마음을 도덕적 진실이 아닌 ‘사용 가능한 도구’로 다루며 타인과 자신을 더 넓은 세계 속에서 이해하도록 이끈다.
오십에 읽는 자본론
자수성가한 자본가와 30년째 마르크스주의자로 살아온 작가의 유쾌한 대화를 통해, 난해한 고전 <자본론>을 오늘의 삶에 밀착된 이야기로 풀어낸다. <자본론>을 모두가 가난해지자는 이론이 아니라, 성과와 효율의 압박 속에서 불안해진 인간의 삶을 이해하는 통찰로 다시 읽으며, 왜 풍요 속에서도 우리는 불안하고 박탈감을 느끼는지 근본적인 질문을 던진다. 임승수 작가는 한 권의 소설로 <자본론>의 핵심적 통찰들을 쉽고 즐겁게 전달하고, 중년의 삶은 물론 인공지능과 로봇이 일상을 바꾸는 지금의 시대에 왜 다시 마르크스를 읽어야 하는지를 설득력 있게 보여준다.
불안사회
한병철은 오늘날 사회의 핵심 질병을 ‘불안’으로 진단하며, 불안이 어떻게 개인을 고립시키고 연대와 자유를 붕괴시키는지를 날카롭게 분석한다. 팬데믹, 전쟁, 기후위기, 취업난, 물가상승 등 거시적 불안과 일상적 불안 속에서 현대인은 생존에 매달린 채 희망하는 법을 잃어버렸다고 말한다. 그렇다면 불안사회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절망의 시대를 넘어서는 유일한 대안으로 저자는 낙관이 아닌 ‘전진으로서의 희망’을 제시한다. 연대와 공감, 희망을 외면한다면 결코 앞으로 나갈 수 없다. 이것이 우리가 불안의 공포 대신 희망의 정신을 가르치고 배워야 하는 이유일 것이다.
만일 내가 그때 내 말을 들어줬더라면
예일대 정신의학과 나종호 교수가 자신의 불안과 우울의 경험을 솔직하게 기록하며, 아픔을 숨기도록 강요받는 사회에 따뜻한 질문을 던진다. 그는 모든 고통은 주관적이며 누구에게나 ‘아플 자격’이 있음을 말한다.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이기 위해, 서로의 약한 모습도 감싸 안는 사회가 되기 위해 결국 필요한 것은 ‘취약성을 드러내는 것’이다. 그리고 취약성이야말로 스스로와 타인을 연결할 수 있는 시작점임을 강조한다. 개인의 고백을 통해 우리 사회가 왜 이렇게 아플 수밖에 없는지를 짚고, 공감과 연대로 나아갈 길을 제시한다.
최대 혜택 할인 쿠폰
대여 eBook 쿠폰
20%
- 이벤트 기간: 2026년 1월 16일 ~ 2026년 2월 15일
- 할인 쿠폰 사용 기간 : ~ 2026년 2월 15일
- 쿠폰은 최대 4장까지 발급됩니다. (한 번에 4장 발급)
- 대여 기간 : 첫 다운로드 시점부터 90일
- 대여하신 도서는 주문 후 바로 보실 수 있습니다.
- 대여 기간 종료 후 대여 도서는 책장에서 삭제됩니다.
- 이벤트 대상 도서는 바뀔 수 있습니다. (이미 구매한 도서의 대여기간은 보장됩니다.)
(주)알라딘커뮤니케이션
대표이사 최우경 사업자등록 201-81-23094 통신판매업신고 2003-서울중구-01520 이메일 privacy@aladin.co.kr 호스팅 제공자 알라딘커뮤니케이션 (본사) 서울시 중구 서소문로 89-31ⓒ Aladin Communication.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