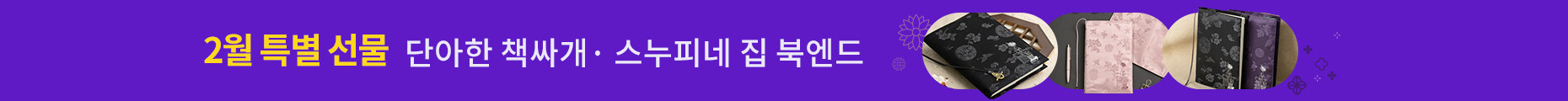|

미술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 연인이다. 사랑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리움 미술관, 무더운 가을 오후, 예술MD이니까 미술을 사랑하는 남자, 이주헌을 인터뷰하다
-글 쓰는 사람, 이주헌 알라딘: 현재 가장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 미술 칼럼니스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비결이나 원동력이라고 하면 뭐가 있을까요? 그러다보니 제가 전공이 없는 사람인데(웃음) 학술적으로 보면 그건 확실한 약점이에요. 그런데 그게 저를 겸손하게 해 줘요. 그리고 그 겸손함이 독자의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도록 하는 원동력이 아닐까 해요. 저는 쌓아놓은 지식보다는 어떤 순간의 영감을 중요시하는 편이거든요. 하나의 아이디어가 머릿속에서 자라나서 계속 가지를 치는 거죠. 책을 내고 나서는 늘 아쉬움이 있지만, 금방 다른 발상으로 머리가 가득 차서 아쉬움은 곧 잊어버려요. 슬럼프가 있을 수가 없죠. (웃음)
알라딘: <지식의 미술관>에서 다섯 개로 나눠진 주제는 사회적 시선, 예술가의 자아, 도상학적 이야기 등 각각 미술을 바라보는 다른 방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한 권의 책 속에서 미술을 둘러싼 여러 측면을 동시에 다룬 대중 미술서는 신선한 시도로 보이는데요. 구상하실 때 어떤 특별한 고민이 있었는지요? 아마 앞으로는 세 번째 종류의 책을 내는 비중이 높아지겠죠. 그건 책을 내는 시기가 어떤 시기냐에 따라 늘 달라져요. 처음에 대중적인 미술 책이 없을 때는 보통 사람들이 자신의 느낌이나 감상에 확신을 갖지 못했어요. 뭐가 맞는지 틀린지를 궁금해 하고 자신감이 없었죠. 그럴 때는 사람들에게 미술 에세이 같은 책이 필요해요. 분석하고 비평하기보다 공감하고 공유하는 게 필요한 거죠. 일단 미술에 친숙해질 필요가 있으니까요. 이제 시간이 흐를수록 독자층이 넓어지기도 하고 깊어지기도 하니까... 앞으로 독자들도 앞서 말씀드린 세 번째 부류의 책들에 좀 더 주목하지 않을까 해요. 미술도 하나의 체계다보니 처음에는 벽 같은 게 있어요. 그렇지만 조금만 익숙해지면 돼요. 미술 테라피나 일상과 미술을 섞은 책들은 그래서 늘 가치가 있어요. 벽을 낮추고 예술의 위로하는 특성을 알려 주니까요. 사람들이 거기에서 위로를 얻고 힘을 얻으면 좋은 거죠. 매우 중요한 일이고, 언제나 중요한 일이죠. 그렇지만 그게 다가 아니라 지식의 확충도 중요한 일이예요. 왜냐면 지적 호기심을 가장 재미있는 방식으로 충족시키는 게 미술이거든요. 언어와는 다른 감수성을 통해서 세계의 다른 면을 바라볼 수가 있으니까요. 그래서 지식을 쌓을 수 있는 책들도 중요해요. 우리나라 독자들도 점점 더 그런 종류의 책들을 좋아하고 있으니 좋은 책들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책, 지식의 미술관 알라딘: 깊이 있는 교양 미술서 얘기가 나왔는데요. <지식의 미술관>의 서문에서는 미술 감상에 있어서 직관적인 접근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책의 본문은 그 직관적 판단을 돕기 위한 일종의 자료집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여 집니다. 개인적으로는 혹시 선생님의 다음 책이 ‘직관적으로 그림 보기’에 대한 본격적인 이야기가 아닐까 매우 궁금한데요. 어쩌면 그건 교양 미술서의 궁극이 아닐까(웃음) 하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기존에 철학자들이나 학자들이 쓴 비슷한 테마의 책들이 있습니다만, 혹시 일반 독자들을 위해 그런 글을 써 보실 생각이 있으신가요? 특정한 분야의 학문 대신 그저 이미지를 계속 봐 오고 그걸 전달해 온 사람으로서, 직관, 이미지를 사유한다는 것, 그리고 거기에서 시작하는 상상력, 그런 것들의 시스템이 늘 궁금해요. 이건 매우 중요한 거거든요. 창의력, 틀을 뛰어넘는 것들의 발상은 어디에서 올까요? 직관에서 오죠. 직관은 말, 언어, 문장이 아니라 이미지적으로 사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논리적 사고 체계와는 다른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는 거죠.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에서 유추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경험 속에 있는 어떤 상(像)에서 갑자기 출발하는 거예요. 갑작스러워서 기존의 세계와 충돌할 수밖에 없죠. 연상은 상에서 상을 잇는 거죠. 그건 언어와는 달리 논리나 체계를 선호하지 않아요. 그걸 뛰어넘는다고 할까... 다른 세계에 있어요. 충격적이고 강렬한 세계죠. 예술가는 모두가 자기 자신의 목적을 위해 작업할 수 있다고 봐요. 그게 돈이 될 수도 있겠고 권력이 될 수도 있겠죠. 그들도 똑같은 인간이니까요. 그렇지만 시간이 흘러 살아남은 작품이나 작가들은 하나같이 보편적인 매력을 갖고 있어요. 시대를 불문하고 전 인류와 소통 가능한 보편성이죠.
-For Fan 알라딘: 책을 읽을 때의 습관이라거나 규칙이 있으신가요? 선호하는 작가라던가... 방금 영화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얼마 전에 개봉한 <서로게이트>라는 영화인데, 영화 자체의 완성도가 높으냐 하면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영화의 아이디어는 좋았어요. 보통 영화에서 로봇이라고 하면 독립적인 지능을 갖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영화에서는 로봇은 각 인간의 완전한 복제품이 되어서 그 주인에게 직접 조종되는 일종의 대리 인간이에요. 이런 것처럼 제가 기존에는 생각하지 못했던 아이디어를 보게 되면 즐거워져요. 나중에 글을 쓸 때도 그런 아이디어들이 좋은 소재가 되고요. 박찬욱 감독의 <박쥐>도 논란이 좀 있지만 저는 참 좋게 봤어요. 이미 대중적인 부담을 상당히 떠안고 있는 감독이잖아요. 그런데 자기 나름의 스타일을 가지고 그걸 밀어붙였어요. 그런 장면장면들, 특히 몇몇 디테일들은 잊을 수 없는 것들이죠. 첫 장면에 나무의 그림자가 비칠 때부터 좋았어요(웃음). 마크 로스코의 그림들도 상당히 좋죠. 꼭 보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저자 인터뷰 보기
|
||||||||||||||||||||||||||||||||||||||||||||
|
|||||||||||||||||||